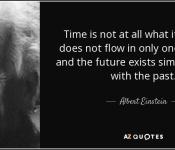버널(Vernal) 폭포 앞에서
여러 번 너를 만나러 왔었다.
계절이 바뀌고, 하늘의 빛이 달라질 때마다
나는 너를 다시 찾았었다.
계절이 바뀌고, 하늘의 빛이 달라질 때마다
나는 너를 다시 찾았었다.
하지만 오늘, 이 5월의 폭포 앞에서,
나는 너를 처음 본 것처럼 숨이 막히고, 말문이 막혔다.
이토록 장엄하고 압도적인 너의 얼굴을 나는 이제껏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서야 너의 이름이 품은 참된 뜻을 알았다.
봄 한가운데, 생의 정점에서 피어나는 너였기에
맘모드급으로 쏟아지는 물은 단순한 낙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이 찢기는 포효였고,
세상이 갈라지는 거대한 굉음이었다.
그것은 하늘이 찢기는 포효였고,
세상이 갈라지는 거대한 굉음이었다.
쏴~ 우다당탕탕!
벼락처럼 내리꽂히며
쿵쾅, 콰광 쾅쾅!
부딪혀라, 부숴라, 쑤셔 박아라!!
벼락처럼 내리꽂히며
쿵쾅, 콰광 쾅쾅!
부딪혀라, 부숴라, 쑤셔 박아라!!
거대한 물의 혀가 바위를 핥고,
내리치고, 쪼개며 폭포는 격렬한 리듬으로 자신을 흘러보냈다.
내리치고, 쪼개며 폭포는 격렬한 리듬으로 자신을 흘러보냈다.
그 굉음은 요세미티 벨리 전체를 삼켰다.
산과 골짜기, 하늘과 나의 이름까지
그 압도적인 힘에 모두가 잠잠해졌다.
나 또한 그 거스를 수 없는 힘에 빨려들어갔다.
그 순간 너는 우주의 흐름 그 자체였다.
세월의 상흔을 안고 지금도 부숴내고 있는 생의 집요함이었다.
미스트 트레일을 따라 젖은 계단을 오르며,
나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선을 조용히 넘었다.
온몸이 물안개에 덮이고, 흠뻑 젖은 옷은 내 살과 하나가 되었다.
햇빛은 저 아래 물안개를 비집고 황홀한 무지개를 피워 올렸다.
그 무지개는 내 마음에 조용히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났다.
비장한 마음으로 나는 너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시작해 무엇을 위해 이토록
돌을 깨고, 안개를 품고 굉음을 삼키며 흘러내리는가?”
그러나 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포효하며 흐를 뿐이었다.
어떤 질문도 받아들이지 않는 묵직한 침묵처럼,
너는 오직 너 자신으로 흘러갔다.
그 흐름 속에서,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포개어 보았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 삶이 얼마나 가볍고 연약한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쩌면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만나러 온 것인지도 모른다.
수천 년의 물줄기와 수천 갈래의 인연이 겹쳐
지금, 여기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와의 인연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이 순간 깨달았다.
너와의 인연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이 순간 깨달았다.
우연이었을까.
운명이었을까.
혹은 내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전의 부름이었을까.
나는 이제 너에게 묻지 않는다.
다만, 오늘 너를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 두었다
오늘의 이 만남, 이 떨림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너는 이제 내 심장과 영혼에 각인되어
앞으로의 세월 동안
내 안에서 조용히, 끊임없이 흐르고,
강렬히 살아 숨 쉴 것이다.
쏴아아~ 우당탕탕!
쿵쾅, 콰쾅쾅… 쾅!
(2025년 5월 11일, 봄의 절정의 버널과 네바다는 그 이름 자체였습니다. 위의 시는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심상을 글로 담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