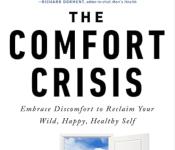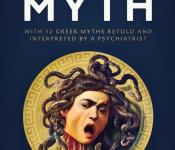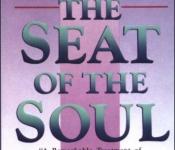<주의: 이 칼럼은 산행과 무관한 내용으로써 한 개인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제공하는 글입니다. 하여, 주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부담없이 패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처음에 산문으로 올렸던 글을, 습작을 위해 시적 산문으로 다시 바꿔 봤습니다.)
<칼럼 47> 허구 속의 '우리', 그리고 진실의 '나'
인류는 언제나 이야기 속에서 숨 쉬어왔다.
이야기는 때로 신화가 되었고,
때로는 진리처럼 반짝였으며,
어떤 날엔 허상으로 우리를 이끌거나 가두었다.
이야기는 때로 신화가 되었고,
때로는 진리처럼 반짝였으며,
어떤 날엔 허상으로 우리를 이끌거나 가두었다.
우리가 ‘진실’이라 믿는 것들,
그 믿음의 틈새에는,
오래된 이야기의 그림자와
과학이라는 이름을 덧입은 새로운 신화가
조용히 숨어 있다.
그 믿음의 틈새에는,
오래된 이야기의 그림자와
과학이라는 이름을 덧입은 새로운 신화가
조용히 숨어 있다.
그럴듯한 설명,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통념,
'팩트'라는 가면을 쓴 가설들…
우리는 그 허구 위에 '우리'를 만들고
서로 기대며 살아간다.
의심 없는 연대.
그러나 그것은 때때로
허구의 집단 속에 진실을 감추는 연막이다.
'팩트'라는 가면을 쓴 가설들…
우리는 그 허구 위에 '우리'를 만들고
서로 기대며 살아간다.
의심 없는 연대.
그러나 그것은 때때로
허구의 집단 속에 진실을 감추는 연막이다.
신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고대의 전설이 아니어도,
종교적 믿음이 아니어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말투 속에,
과학 교과서의 각주 속에,
유튜브 영상과 뉴스 해설 속에
은밀히 스며들어 있다.
고대의 전설이 아니어도,
종교적 믿음이 아니어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말투 속에,
과학 교과서의 각주 속에,
유튜브 영상과 뉴스 해설 속에
은밀히 스며들어 있다.
에스키모어의 눈(雪)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눈과 함께 살아가니 수십 가지 눈의 어휘들을 갖고 있다는
그 매혹적인 설화이다.
그러나 그것은 언어의 구조에서 비롯된 착시였고,
우리는 언어 구조적 파생을 문화적 진리로 오해한 것이다.
그들은 눈과 함께 살아가니 수십 가지 눈의 어휘들을 갖고 있다는
그 매혹적인 설화이다.
그러나 그것은 언어의 구조에서 비롯된 착시였고,
우리는 언어 구조적 파생을 문화적 진리로 오해한 것이다.
즉, 문화적 환경이 언어를 결정한다는 오해 말이다.
그 신화는,
세상의 인식 속으로 퍼졌고,
마치 사실인양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그 신화는,
세상의 인식 속으로 퍼졌고,
마치 사실인양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의학과 과학도 예외가 아니다.
심장을 해친다는 허구의 콜레스테롤 가설과 포화지방에 대한 세뇌된 공포,
우리는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달콤한 낭설.
그 모두가 근거를 잃고도,
여전히 광고가 되고, 슬로건이 되고,
'전문가'의 말투로 다시 살아난다.
신화는,
진실이 아니라 반복으로 남는다.
우리는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달콤한 낭설.
그 모두가 근거를 잃고도,
여전히 광고가 되고, 슬로건이 되고,
'전문가'의 말투로 다시 살아난다.
신화는,
진실이 아니라 반복으로 남는다.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믿고,
쉽게 머무는가?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말한다.
쉽게 머무는가?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말한다.
"허구로 구성된 신화와 종교는 협력을 가능케 하는 집단의 문법이다."
신화 연구의 대가인 조셉 캠벨은 말한다.
"신화는 우리 내면과 우주의 구조를 잇는 다리다."
신화 연구의 대가인 조셉 캠벨은 말한다.
"신화는 우리 내면과 우주의 구조를 잇는 다리다."
그 다리는 때로,
불확실한 세계를 건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그러나 어떤 다리는
더 이상 강을 건너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그 자리에 묶어둔다.
불확실한 세계를 건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그러나 어떤 다리는
더 이상 강을 건너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그 자리에 묶어둔다.
신화는 길이 될 수도,
안개가 될 수도 있다.
위안이자 미로,
방향이자 족쇄.
안개가 될 수도 있다.
위안이자 미로,
방향이자 족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허구를 부정하지 않되
그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허구를 부정하지 않되
그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을 줄 아는 사람.
“이 이야기는 누구의 것인가?”
“이 믿음은 지금도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가두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누구의 것인가?”
“이 믿음은 지금도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가두고 있는가?”
의심은 배신이 아니다.
그것은 탄생의 예고다.
질문은 경계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의 첫걸음이다.
그것은 탄생의 예고다.
질문은 경계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의 첫걸음이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신화 속을 지나간다.
그 신화에 기댈 수도,
그 신화를 끌고 걸을 수도 있다.
크고 작은 신화 속을 지나간다.
그 신화에 기댈 수도,
그 신화를 끌고 걸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의 길은 언제나 홀로 걸어야 한다.
내가 선택한,
‘나’의 길이어야 한다.
진실의 길은 언제나 홀로 걸어야 한다.
내가 선택한,
‘나’의 길이어야 한다.
어느 날,
오래 믿어온 문장이 문득 낯설어질 때,
너무도 자연스럽던 신념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할 때
오래 믿어온 문장이 문득 낯설어질 때,
너무도 자연스럽던 신념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허구의 우리’에서 걸어나와
‘진실의 나’로
되돌아가는 시간일 것이다.
우리가 ‘허구의 우리’에서 걸어나와
‘진실의 나’로
되돌아가는 시간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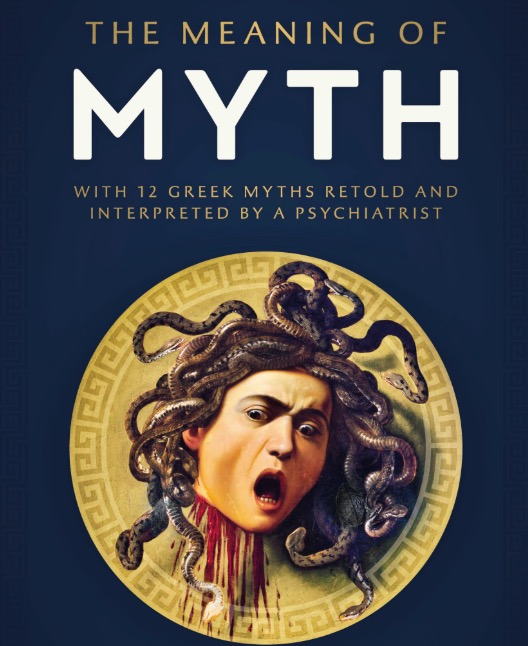
 <칼럼 48> 버널 폭포 앞에서
<칼럼 48> 버널 폭포 앞에서
 The Whale
The Wh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