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칼 2> 통달의 평범성 (1 부)
20세기 최고의 천재라고 알려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의 원리로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인물이었다고 한다. 어렸을 때는 모국어 습득이 너무나 더뎌서 부모님들이 심히 우려를 하였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성적은 형편없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뒤안길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으로 혁명적인 ‘진화론' 가설을 들고 나와 당시 기존 주류 세계관을 발칵 뒤집어 놓은 찰스 다윈은 20대 청년 때까지 집안 형제들 중에서 가장 밝지 못하고 덜 떨어진 탓으로 아버지는그에 대한 실망과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속이 다 타들어갈 정도였다고 한다.
세기의 화가 반 고흐도 어려서 성격이 괴팍하고 우울한 아이였고 사회성이 크게 모자라서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으며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을 잘 못해서 여러 직장을 전전해야 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기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도 부실한 성적과 청력 상실 등으로 12학년 쯤에 학교에서 아예 쫓겨날 정도로 어린 시절에 두각을 발휘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별 볼일 없는 인물들이 인류사에서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대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위대한 족적들들을 남길 수 있었었을까?
이런 평범함을 면치 못했던 인물들이 훗날에 거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원리로 가능했을까?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에 답하는 책으로서 Mastery (통달, 2013)를 Amazon Kindle로 구입해서 읽어 보았다. 지구를 거쳐갔던 28명의 굵직굵직한 대가(Master)나 달인들의 평범했으나 위대했던 삶을 분석한 저자(Robert Green)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 인물들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던진다.
많은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은 어릴적부터 탁월한 재능을 타고나는 것 같아 보이나 실은 내밀하게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보면, 많은 경우에는 아주 평범하거나 두각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 후천적으로 재량과 기량을 갈고 닦았고 그것은 집요한 집중과 연습, 그리고 수만 시간의 헌신적 갈고 닦음을 통해서 결국 특정 분야에서 ‘통달’ 혹은 ‘달인’의 경지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어떤 영역이나 분야에 (1) 호기심(Curiosity)과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은 (2) 열정(Passion)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3) 목적 의식(Sense of Purpose)을 낳고 이어 그 목적을 위해 수많은 시간 동안의 연습을 통해 (4) 자율 혹은 자유자재한 수준(Autonomy)이 되고 그게 더 나아가 마침내 (5) 거장(Master)과 통달(Mastery)의 경지를 이룬다는 것이다.
Phyllis Lane의 '만 시간의 법칙(10,000 hours: You Become What you Practice)'이라는 책에서도 만 시간을 연습한 음악가는 지휘자가 되고 7000시간을 연습한 음악가는 솔로이스트가 되며, 5000시간을 연습한 음악가는 음악 선생이 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타고난 재능보다는 그 사람이 투자한 시간과 연습량에 좌우한다고 일갈한다.
이런 거창한 주제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데?
이 통달이라는 주제를 접하면서 최근에 나는 또 하나의 주제인 몰입(Flow State)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았다. 통달을 얘기할 때 이 몰입의 과정을 빼 놓을 수 없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실은, 바로 이 몰입이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좀 나눠보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됐다.
작금에 우리는 집중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집중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넘쳐나는 정보와 미디어의 홍수 속에 스마폰 등의 기술의 발달로 멀티태스킹이 일상화되고 지속적인 집중을 못하는 산만한 생활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파고들었다.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집중력 문제로 수년 간 이 문제는 나의 삶의 숙제이자 큰 화두가 된 적도 있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만 시간의 연습과 단련을 통해 거장의 단계까지는 못 가가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주의 산만 상태에서 벗어나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할 수 만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운전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홀로 산행을 할 때조차도 몰입의 경지에서 할 수만 있다면, 흐르는 시간이 멈추고 내가 잊혀진 채 '움직임' 혹은 ‘함’ 자체와 하나가 돼서 그 과정만이 있을 것이고, 그 때 우린 비로소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 그저 누구나 아는 뻔한 얘기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체험으로 발현되는 그 힘이 너무도 생생하기에 거듭 이 문제에 천착하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소한 3분짜리 비디오를 편집을 할 때조차도 그 몰입의 경지가 없다면 그 단조롭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 수 십 시간들을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몰입이라는 경지가 있어 그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하여, 통달까지는 아니더라고 일상 속에서 하는 특정 행위나 일에 몰입하는 것이야 말로 이 산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행복의 길이 아닐까라는 발칙한 발상을 거듭 해 보면서 다음 기회에 몰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끄적거려볼까 한다. (To Be Continu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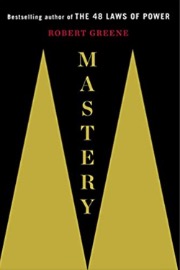
 <창칼 3> 나의 저탄 체험기
<창칼 3> 나의 저탄 체험기
 악어와 별
악어와 별











